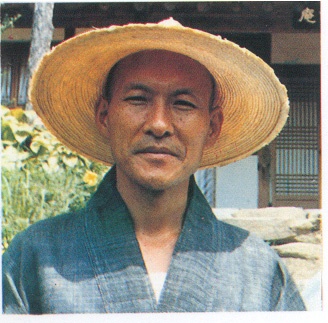2010. 5. 11. 19:00ㆍ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오매일여
<사람들은 왜 모를까> - 김용택
마른 풀꽃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누가 알랴 사람마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저문 산아래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김용택은『섬진강』연작을 통해 순수서정과 사회 역사적 분노를 결합할 수 있는 시를 수일하게 보여준 시인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바로 그 순수서정과 내면의 울림이 행복하게 조우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울러 그의 많은 시에서 드러나는 시의 평면성을 극복해낸다. 그는 아마 이별의 서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런 그 앞에는 풀잎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서 햇살 속에 빛난다. 그럼에도 사람마다 어디에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고, 그 까닭에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 보는 산의 흰 이마도 서럽다. 하지만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그 꽃은 겨울의 삭풍한설에 찢긴 자리에서 피어난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고통 속에서 피어나고 그 고통은 또 꽃처럼 천천히 피어난다. 비록 오늘 고통스럽지만 몽땅 산 뒤에 있는 그리운 것들을 다시 그리워하다 보면 뒤로 오는 다정한 여인처럼 손에 닿지 못하는 것들이 꽃들이 되어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한 사람을 위로하지만 사실 저문 산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내면의 울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 시인 자신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자 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웠을 뿐이지 실상은 시인 자신의 내면이 형상을 입은 경우라는 이야기다.
|
'불교(당신이 주인님입니다) > 오매일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용히 나를 생각하는 시간 (0) | 2010.05.13 |
|---|---|
| 어리석음과 깨달음 (0) | 2010.05.12 |
|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0) | 2010.05.09 |
| 심전경작[心田耕作] (0) | 2010.05.06 |
| 충분한 사랑은 좋은 교육의 첫 번째 (0) | 2010.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