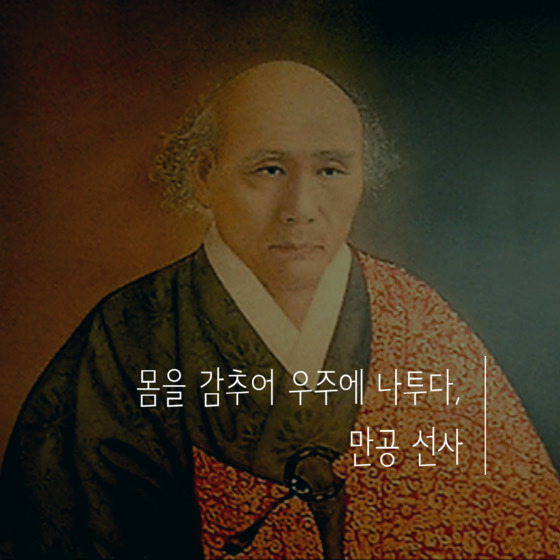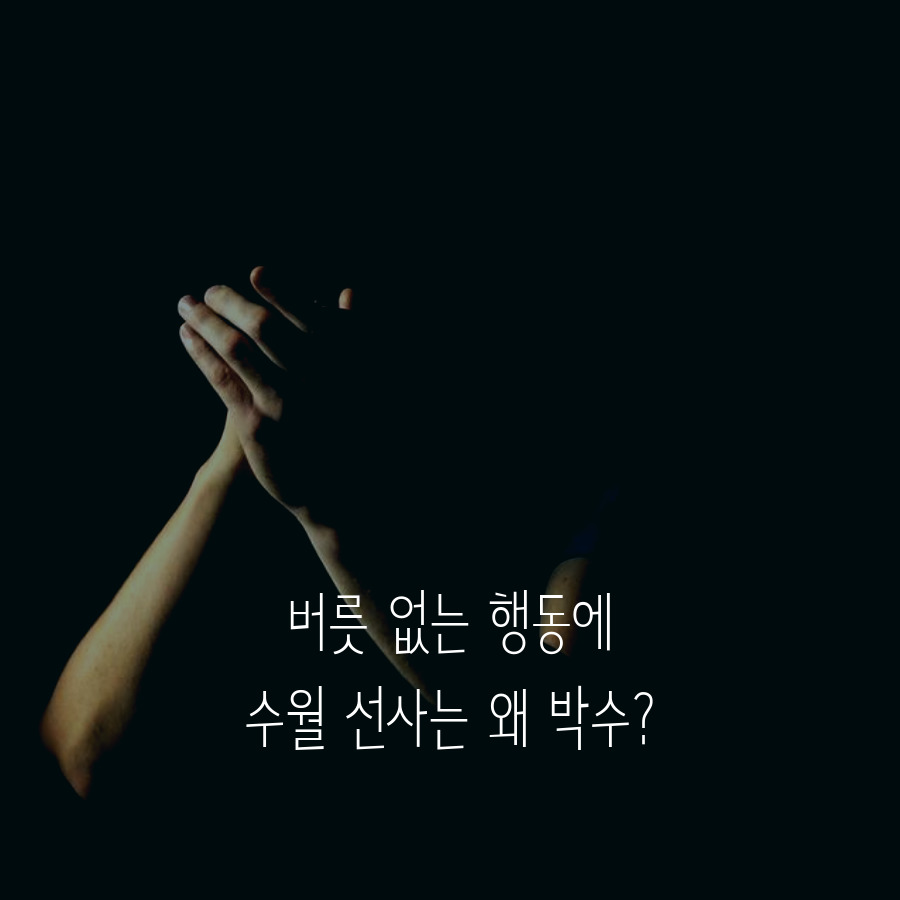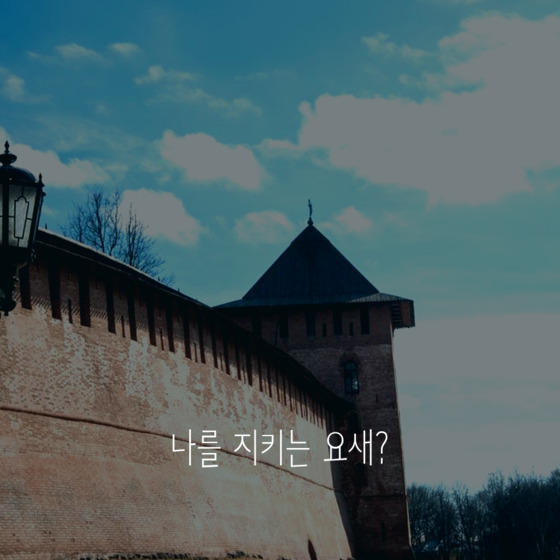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경허 선사를 아시나요? 일제 강점기에 한국 불교의 선맥(禪脈)은 바람 앞 등불이었습니다. 수행의 가풍은 사그라지고, 일제에 의한 불교 왜색화가 진행됐습니다. 출가자는 일본의 강제에 의해 대처승이 돼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의 불씨를 되지핀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허 선사입니다. 수덕사 조실을 지냈던 그에게는 달(月)의 이름을 딴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월(水月)과 혜월(慧月), 그리고 만공(滿空)이었습니다. 그들을 ‘경허의 세 달’이라 불렀습니다. 물에 비친 달 수월, 지혜로운 달 혜월, 그리고 몸을 감추어 우주에 나투는 그믐달 만공입니다. 하루는 수월과 만공이 방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월 스님이 갑자기 옆에 놓인 숭늉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걸 만공 스님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만공. 이것을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한 마디로 똑바로 일러보소!”
참 황당하지 않나요? 숭늉 그릇이 숭늉 그릇이지, 그걸 숭늉 그릇이라 해도 안 되고,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니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얼굴에 그릇을 들이대며 수월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요?
그런데 만공 스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수월 스님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던 만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월이 내민 숭늉 그릇을 낚아채서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끼익’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공 스님은 숭늉 그릇을 마당 쪽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세게 던졌다면 ‘와장창!’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겠지요.
그런 뒤에 만공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수월 스님은 만공의 건방진 행동에 야단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잘 혔어, 참 잘 혔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쏭달쏭하신가요? 선문답 일화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물음표’가 돋아나게 합니다. ‘수월 선사는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숭늉 그릇이라 해도 안 되고,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을까. 요즘 젊은이들 표현 마냥 숭늉 그릇과 무슨 썸타는 관계라도 되나? 만공 스님의 반응은 또 뭐지? 그릇을 다짜고짜 마당으로 던져버리다니. 그런 버릇 없는 행동에 수월 스님은 왜 또 박수를 친 거지?’
물음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월과 만공이 우리에게 화두(話頭)를 던졌으니까요.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처럼, 이야기 속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각의 체온, 궁리의 체온으로 수월과 만공이 건네는 알을 품는 겁니다. 어디, 하나씩 차근차근 품어볼까요?
수월 스님이 느닷없이 뭘 하나 쑥 내밀었습니다. ‘숭늉 그릇이라 해도 안 되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것도 숭늉 그릇을 내밀면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답답해지고 맙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꽉 막혀 버리고, 뒤로 빠지는 퇴로도 꽉 막혀 버립니다. 게다가 숭늉의 ‘숭’자만 꺼내도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생각의 수갑, 마음의 감옥은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가 우리가 첫 물음을 던질 지점입니다. ‘수월 스님이 내민 것은 과연 뭘까.’ A를 내밀면서, A라 해도 안 되고, A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음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언뜻 보면 그냥 ‘선적인 물음(禪問)’으로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수월 스님이 내민 것은 ‘선문(禪問)’을 가장한 수갑이자 감옥입니다. 무슨 수갑이냐고요? 생각의 수갑입니다. 무슨 감옥이냐고요?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걸 우리가 멋모르고 덜컥 받은 겁니다. 그러니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수월 스님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임(Frame)’ 혹은 ‘패러다임(Paradigm)’입니다. 그런 틀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순식간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숭늉 그릇이라 해도 안 되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의 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틀을 받아들자마자 ‘꼼짝 마!’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만공 스님은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수월 스님이 내민 수갑의 정체를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숭늉 그릇을 낚아 채 밖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걸 깨버린 겁니다. 실은 그릇을 깬 게 아니라 생각의 틀, 생각의 감옥을 깨뜨린 거죠. 그게 수월의 선문(禪問)에 대한 만공의 선답(禪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이 “참 잘 혔어”라며 만공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시나요? ‘아니, 숭늉 그릇이 우리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지? 선사들끼리 주고 받는 ‘고차원의 농담’이라면 우리가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월과 만공이 주고 받은 메시지는 구름 위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지지고 볶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스스로 수갑을 찹니다.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뒤에는 어김없이 “답답해 죽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항상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라고 하소연합니다. 차근차근 따져 보세요. 수갑과 감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수갑과 감옥의 정체가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세운 잣대와 내가 만든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의 수갑, 생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어떡해야 그 수갑을 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수갑 푸는 법을 설했습니다. “상(相)이 상(相)이 아닐 때 여래를 보리라.”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고집이 고집이 아닐 때 진리를 보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워놓은 생각의 틀, 고집의 틀을 과감하게 부수라는 뜻입니다. 만공 스님이 숭늉 그릇을 낚아채 밖으로 ‘휙!’ 던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나마 버티는 이유가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집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라고 합니다. 갇혀만 있던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틀’을 한 번이라도 부수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임을 말입니다. 안에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틀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게 보입니다.
중국에는 ‘덕산 방, 임제 할’로 유명한 덕산 선사가 있습니다. 그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물음을 던져 놓고 몽둥이 찜질로 가르침을 폈던 인물입니다. 만약 덕산 선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다면 말입니다.
“대답을 해도 30방, 대답을 못해도 30방이다. 자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내놓을 답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할 건가요, 아니면 침묵을 지킬 건가요? 어느 쪽을 택하든 몽둥이 30방이 날아옵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생각의 프레임’에 갇힐 때는 깨버리면 됩니다. 숭늉 그릇을 깨듯이 틀을 깨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울타리로 없는 운동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서는 대답을 해도 좋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숭늉 그릇이라 해도 좋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자유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잣대, 나의 고집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운동장이 펼쳐집니다. 수월과 만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을 깰 때 더 자유로워 진다. 왜냐하면 본래 내 마음에 어떠한 틀도 없기 때문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