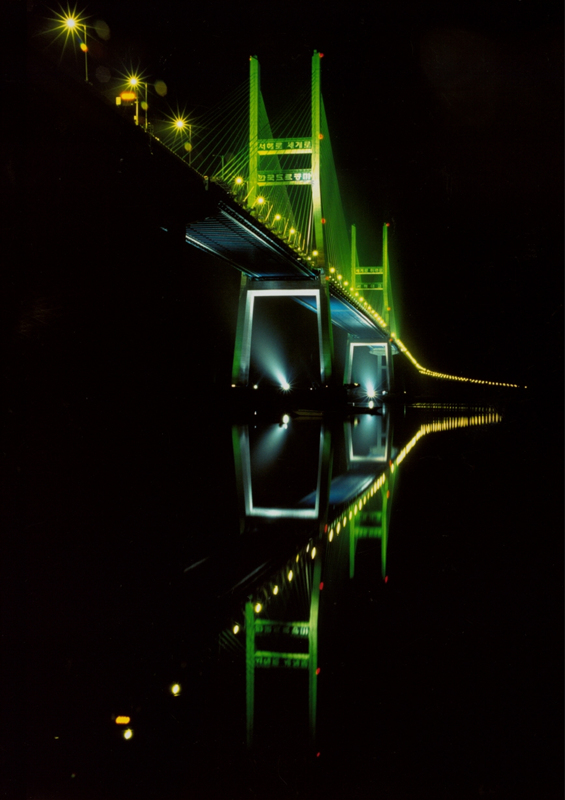저는 '불법'에 접하게 된 초기에, '미혹의 장애'(惑障)에 견혹(見惑)과 수혹(修惑)의
두 가지가 있다는 대목에서 꽤 당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견혹'이야 미혹한 중생이 견해가 원만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니,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데, '수혹'이라는 건 <'닦으려는 마음'이 곧 미혹에 해당한다>
는 뜻이니, 당혹할 수밖에요. 모름지기 어리석은 범부가 갈고 닦아야 미망(迷妄)에서
헤어날 수 있을 텐데, <닦으려고 하는 마음>도 미혹에 해당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수행자라면 누구라도 필히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여기서 길을 올바로 들지 못하면 결국 아까운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고 아무 공도 없을 테니,
이건 큰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문을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문경새재에서 깜박 졸다가 선잠에서 깨어나서는 도루 터덜터덜 남행 길에
접어든 꼴이니, 참 등에서 식은땀이 날 일이 아닙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니, 여러분도 부디 길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佛法)은 본래 '생멸법'(生滅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꾸미고 짓고 하는 모든 조작이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전혀 붙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 '번뇌'를 여의고 '보리'를 구하는 것이나,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기를 바라는 것이나, '미혹함'을 여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 등이 모두
'생사법'(生死法)이라는 사실입니다.
― 마음에 마땅하면 취하고, 마땅치 않으면 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무명 번뇌'
(無明煩惱)의 표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무명(無明)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에 뜻을 뒀는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안정되고 보다 쾌락한 삶을 얻기 위해 열심히 털고 닦고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한 시도 가만 두질 못하지 않습니까?
좀 영리하다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다시 '닦는 일'을 그만두려고 애쓸 테구요.
따라서 열심히 '닦는 자'도 '게으른 자'도 결국 다 '지음이 있는 자'(作爲者)들이기 때문에
'불법'과는 멀리 어긋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입니다.
따라서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도 결코 온당치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 결국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범정의 소견'(情見)으로 제 몸과 마음을
묶어 놓음으로써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 있는 그 '성스러운 성품'(聖性)을 등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정혜의 힘'(定慧力)으로 스스로 잘 살펴서, 모름지기
모든 '일'에 체(滯)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약산(藥山)이 법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스승인 석두(石頭)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하기를,···
『그대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히 앉은 것>(閑坐)이로구나.』
『만약 '한가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함이 있는 것>(有爲)입니다.』
『그대는 지금 '하지 않는다'(不爲)고 말하는데, 그 '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고 다그치니, 약산은 대답하기를, ···
『천 성인도 알지 못합니다(千聖亦不識).』라고 했습니다.
원오근(圓悟勤)이 나중에 이 화두를 들고(拈) 말하기를,···
『말해 보라! 필경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어찌하여 천 성인이 알지 못하는고?
이미 천 성인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사는고?
따라서 '이 일'(些子事)에 대해서는 그대들의 사량계교(思量計較)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가까이할 수도 없고 귀신도 엿볼 수 없나니, 천만 겹의 나쁜 지해(知解)를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 눈'(心眼)이 스스로 보겠거니와, 만약 '소견의 가시'(見刺)를 제하지 못하여
'얻고 잃음과 옳고 그름'(得失是非)의 관문에 걸린다면 영원히 교섭할 길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죽암규(竹庵珪)가 소참 때, 이 이야기를 들고는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지는가, 아닌가? 그대들 여러분이 한가히 앉았을 때엔 오직 어지러이
생각을 굴려서, 매양 망식(妄識) 망정(妄情)으로 분별을 일삼으니, 어찌 한 생각 몰록 쉬어서
참으로 한가히 앉아 보겠는가?
도거(掉擧; 들뜸)가 아닌가 하면 벌써 문득 혼침(昏沈; 가라앉음)에 빠지나니,
'도거'는 곧 경계를 좇는 분별이요, '혼침'은 어두컴컴한 졸음이니, 언제 한가로이
앉아 보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 간에
일찍이 실오라기만한 작은 일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과 '혜'를 가지런히 닦는 것>(定慧雙修)일까?
이 물음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전에 보면 '정혜쌍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정혜쌍수'(定慧雙修)가 곧 '경행서보'(徑行徐步)가 된다」고 한
대목이 그것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기를, 「여기서 '행'(行)은 곧 '관'(觀)이니,
<'고요한 마음'에 머물지 않음>이요, '서'(徐)는 곧 '그침'(止)이니,
<'산란한 마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 설명을 들으면 '정혜쌍수'가 무얼 뜻하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 바로 이 짐작하고
이해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천 성인도 역시 알지 못한다는 그 자리>는 결코 중생의
정식(情識)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머리를 굴리면서, '그 자리'에 대해
집요하게 궁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범부의 근성입니다.
여기서 '경행'(經行)이라는 말이 보통 때 어떻게 쓰이는 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저기 뒤져봤더니, '경행'은 곧 '아진'(我 ワガママ)이라는 겁니다.
이 일본말은 '멋대로 한다'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진'(我 )이라는 글을 잘 살펴보세요. <我+人+盡>, 즉
<'나'라는 '사람'이 '다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고로 '나'가 없으니, '내 처지'니 '내 주장'이니 하는 따위가 붙을 데가 없고, 그러면
'나'와 '바깥 경계' 사이에 있었던 팽팽한 대립관계나 갈등관계는 저절로 해소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한다"는 말은 <멋대로 할 '나'>가 있어서 '내 뜻'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가 본래 없어서 오직 시절과 인연을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혜가 쌍으로 행하는'(定慧雙行) 거기엔 이미 능·소(能所)가 없어서,
전혀 '자기 중심적인 조작'이 없기 때문에 그 행(行)이 간단(間斷)이 없으며,
다만 뜻에 맡겨 자재할 뿐, '동·정'(動靜)간에 일체의 차별법을 굴리는 데 전혀 걸림이
없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이분법(二分法)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우리들이 이 불가해(不可解)한 명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의식'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한, '지견(知見) 놀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현들이 항상 경책하기를, 「'나'와 '내 것'이 있으면 바보요, '나'와 '내 것'이
없으면 멍청이니라」라고 했던 겁니다.
끝내 이 '있고 없음'의 양변은 삼키기 어려운 '벌겋게 달구어진 쇳덩이'임에 틀림없습니다.
― 혹시 누군가가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평생 칠통(漆桶) 소리를 면하기는
틀렸다는 걸 명심할 일입니다.
세존(世尊)이 어느 날, 장조 범지(長爪梵志)와 토론을 하는데, 범지가 미리 언약하기를,···
『만약 나의 '이론'이 진다면 내 스스로 목을 베겠습니다.』 했어요.
이에 세존께서 묻기를,···
『그대의 '이론'은 무엇으로써 '종'(宗)을 삼는가?』
『나의 '이론'은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써 '종'을 삼습니다.』
이에 세존께서 다시 묻기를, ···
『'지견'을 받아들이는 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하시니, 범지는 소매를 털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도중에 가서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깊은 뜻을 깨닫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
『나는 다시 돌아가서 머리를 베어 세존께 사과해야 하겠다.』고 하니, 그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
『스승께서는 인간과 하늘의 무리들 앞에서 다행히 이기셨거늘 어째서 머리를 베겠다고 하십니까?』
하니, 범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차라리 지혜 있는 사람 앞에서 목을 벨지언정,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이기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
『나의 '이론'이 두 곳에서 패했으니, ― 만약 <지견을 받아들인다면> 그 허물이 거칠 것이요,
<지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허물이 미세할 것이니라. 모든 인간과 하늘과 이승(二乘)
들은 모두 나의 이론이 '빠진 곳'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나, 오직 대각세존(大覺世尊)과
여러 보살들만이 나의 이론이 '떨어진 곳'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
『저의 '이론'이 두 곳에서 패하게 되었으니, 머리를 베어서 부처님께 참회하겠나이다.』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회심(廻心)하여 출가하라.』 했습니다.
이에 범지는 오백 사람의 문도(門徒)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여 각기 깨달음의 지위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무용전(無用全)이 이 화두를 들고 다음과 같이 송했습니다.
지견을 받아들이면 눈에 든 티요
지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일은 어긋나네.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공연히 회수(廻首)하니
도깨비도 귀신도 한 구덩이에 묻혔도다.
여기서 <공연히 머리를 돌렸네(廻首)>라고 송(頌)한 것은, 범지(梵志)가 출가한 사실조차
공연한 짓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험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관쌍수'(止觀雙修, 定慧雙修)의 길이 이론으로 시종할 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관'(止觀)을 닦는 데 있어서, '지'(止)가 과하면 곧 '혼몽하게 가라앉고'(昏沈),
'관'(觀)이 과하면 곧 '들떠서 요동하니'(掉擧), 그러므로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으면>
(不沈不擧), 이때 비로소 <대경(對境)을 올바르게 껴잡는 마음자리>(正受)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으면' 이것이 바로 중도(中道)에 가지런히
계합(契合)하는 거구요.
그러나 이에 이르러서도 그 이중성의 칡넝쿨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우리들의 발목에
감겨든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생각을 일으키는 것'(起念)도
'조용히 관하는 것'(止觀)도 끝내는 모두가 움직임일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모두 부정하는 것'(雙非)이나, '양변을 모두 보내는 것'(雙遣)이나,
이 모든 것이 끝내는 '쓸데없는 말장난'(戱論)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정·혜를 가지런히 닦는다'(定慧雙修) 하더라도 끝내는
<다만 무심히 모든 것을 담담히 비출 수 있어야>(寂照) 비로소 모든 게 다 쉬어서,
바로 '진리의 길'을 조용히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거나, 또는 정당화하거나 하는 일체의 조작을 당장 그만두고,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세로> 그저 조용히 비추기만 한다면,
내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곧 머지않아서 그 '금강 같은 법신'(金剛法身)이 우뚝
드러나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그런 결과를 기다리거나, 조급하게 재촉하는 일이 있으면 곧,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따라서 결국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도(道)를 담담히 따르는 것이 바로
'일승의 법문'(一乘法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비구'(比丘, Bhiks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구'라는 말은
이쪽 말로는 '다툼을 멸한다'(滅諍)는 뜻이 됩니다. 즉 '있고 없음'이나 '옳고 그름'이나,
그 밖의 온갖 번뇌의 '다툼'을 멸(滅)하는 것이 곧 '부처님 제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의 이 '이분법적인 지견'이 능히 '진리'를 장애하기 때문에, 우선 모름지기
<무념 무사의 삼매>(無念無思三昧)로써 이것을 그쳐야만(止) '바른 지혜'(正智)가
바야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멸쟁'(滅諍)이 되는 겁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참된 관'(眞觀)은 <뜻을 짓지 않고 경계를 비추므로 항상 비추는 바가 걸림이 없으며>,
'참된 그침'(眞止)은 <'성품의 여읨'(性離)을 체득하여 모든 '허망'을 몰록 쉬어서 온갖
'집착'이 스스로 고요한 것이다>. 따라서 털지 않고 닦지 않아도 <'성품'이 본래 스스로 깨끗함>
이니 곧, '깨끗함조차 없는 깨끗함'(無淨之淨)이 가만히 '부처의 경계'를 밟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요'(心要)이니, 후학은 모름지기 잘 생각하여 행할지어다.』하였습니다.
- 대우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