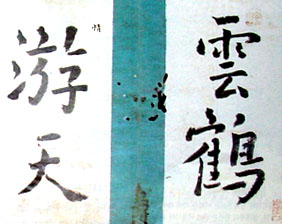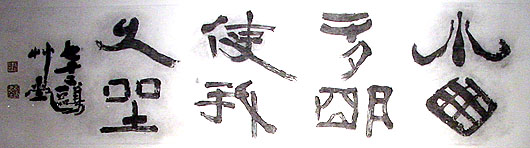티끌(미진)이 모여서 산하대지를 이루고 중생이 그 산하
대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을 중생계의 성립
이라 한다.
다시 겁이 다하여 티끌이 흐트지면 산하대지와 더불어
중생의 육도(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세계도 무너져 새로운 겁이 설립된다고 한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모이고 흐트지며 시작과 종말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시공의 속성임을 안다면. 모든
법이 늘 인연따라 생하고 변멸하여 항상 하지 않으므로
허깨비 일 같이 허망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근본을 모르고 잠깐 나타난 화려한 허깨비 꽃을
탐하고 찾는 것은 악마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어리석은 범부들의 일이다.
이 허깨비 꽃과 같은 세계는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모두 나라고 집착 하는 데서 부터 시작된 것이고 인간
이니 중생이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생명을 부
지한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생
긴 것이 아니다. 나라는 상에 집착됨이 있지 않다면 세
계라는 가설도 성립될 수 없기에 허깨비 꽃과 같은 세계
라 하는 것이다.
고로, 온 세계를 잘 부서지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다
고 보고 악마가 유혹하기 위해 피운 꽃임을 알고 모든
살림이 허깨비 장난처럼 느껴져서 온갖 악마의 유혹을
잘 견디고 공덕화(오온이 공함을 알고 여여한 행함이
꽃 처럼 피어나 향기를 발하는 덕)를 널리 펼쳐 생사
윤회의 고리를 끊고 모든 액난을 건넌다면 다시는 생사
고해의 강에 빠져 허우적 거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악마가 피운 꽃이란 무엇인가?
곧, 항상하지 않은 것을 항상한 것이라고 하여 집착하
게 하고,
생노병사의 길을 축복 받은 길이며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라고 집착하게 하며,
그르므로 이몸 이형상 이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길
집착하게 하며,
이와 같이 무상함을 탐하고 지키기 위해 거짓말 하고
도둑질하며 음탕하고 살생하는 어리석음을 악마가 피운
꽃이라하며,
열반적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는 것을 악마가 피
운 꽃이라고 한다.
이 악마의 꽃 피움을 꺽어버리면 다시는 [무명을(창조
신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거나 四相을 의지처로 한 어
리석음]의 나고 죽음의 고를 보지 않을 것이라 하시네.